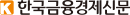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김성훈 기자 | 처음 ‘몽골’에 가기로 마음먹은 건 7년 전, 2019년 여름이었다. 이유는 조금 황당하게도 친구들과 함께 떠난 ‘내일로’ 여행 때문이었다. 영월에서 진행된 은하수 투어를 통해 마주친 은하수에 시선을 뺏긴 우리는 ‘몽골 초원의 은하수가 그렇게 예쁘다더라. 가자!’며 의기투합해 몽골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몽골과는 조금의 연관도 없는 생뚱맞은 지역을 ‘은하수’ 하나로 연관 지은 것 같지만, 사실 디테일의 차이는 있어도 ‘은하수’는 ‘은하수’니까 완전히 억지는 아닌 셈이다.
하나둘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 어느새 일정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고 있었다. ‘몽골까지 가는데 이왕 떠난 거 시베리아도 횡단해보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설렘을 안고 경비를 모으고 있던 우리의 여행은 부푼 기대만큼 빠르게 터져버렸다. 바야흐로 팬데믹(특정 질병의 전 세계적 유행) 시대, 코로나19의 시작이었다.
흐르는 시간만큼 ‘몽골 여행 계획표’ 위에 쌓여가던 먼지는 엔데믹과 함께 흩어졌다. 빛바랜 계획표에 잉크를 덧칠한 우리는 하나씩 빠르게 계획을 실행했다. 관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투어사를 찾은 후 몽골 동행 모집 카페를 통해 함께 여행할 동행을 모집했다. 다행히 빠르게 구해진 덕에 처음 마음먹은 날로부터 6년여가 지난 2024년 8월 3일, 마침내 몽골 땅을 밟았다.

몽골은 한국과는 참 많은 게 다른 나라였다. 한국에서는 ‘김제지평선축제’라는 축제가 있을 정도로 보기 힘든 지평선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푸르공을 타고 무작정 길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졌다.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만큼 창밖의 지평선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양분하는 별거 아닌 그 선 하나가 몽골을 여행하는 내내 뒤를 쫓아다녔다.
8박 9일의 일정 동안 몽골 중부에서 남부를 종단했다. ‘작은 장소의 바위’라는 뜻으로 옛날 몽골의 불교 지도자가 숨어 생활하기도 했다는 ‘바가가즈링촐로’부터 ‘욜이 사는 계곡’이라는 뜻의 ‘욜링 암’, 고비 사막 ‘홍고린엘스’, 불타는 절벽 ‘바양작’,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 ‘차강소브라가’, 거북바위가 있는 ‘테를지 국립 공원’까지. 8박 9일 동안 다녀왔다고 하기에는 적어 보이지만 알차고 즐거웠던 투어였다.

사실 몽골은 즐거웠지만 쉽게 추천하기는 힘든 여행지다. 8박 9일 동안 하루 6~9시간 이동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12시간을 넘게 이동한 날도 있었다. 한국처럼 몽골 전역에 아스팔트 길이 잘 깔려있지도 않아서 이동 시간의 절반 이상은 오프로드를 달렸다. 이정표도 없는 오프로드 길을 막힘 없이 달리는 기사님이 신기해 보였다.
한참을 질주하다 차를 살펴봐야 한다며 길가에 멈춰서는 돗자리를 피고 피크닉을 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동 중에 바퀴가 빠진 차를 발견해 해당 차를 타고 있던 투어객을 태우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한여름 사막의 무더위는 밤이 된다고 식지 않았다. 인터넷도 전기도 되지 않는 한밤중에는 휴대폰 라이트에 의지해 동행들과 보드게임을 즐겼다. 우유와 요거트를 잘못 먹고 탈이 나 귀국하는 날까지 고생했고, 하루종일 이어지는 고온에 더위를 먹기도 했다. 삼시 세끼 나오는 양·말·염소 고기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향신료 냄새도 잡내도 심하지 않았다. 다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버거울 만큼 채소와의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아 여행하는 내내 배가 무거웠다.
그러니 결코 편한 여행은 아니었다. 여행과 고행 그 사이 어딘가의 강행군을 한 번 겪고도 반년 뒤 겨울 다시 몽골로 떠난 것은 6년 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은하수 하나가 여행의 목적을 완벽히 달성시켜줬기 때문이다.

“이미 성공했다.”
마침내 몽골의 대초원에서 은하수를 만난 여행 이틀차, 이미 여행을 끝낸 것과 마찬가지였다. 3일, 4일 여행을 지속하며 만난 두 번째 세 번째 은하수와 사막 등 여러 이국적인 풍경들은 추가 보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때의 경험은 그해 겨울 몽골 여행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동행을 구했지만 설 연휴가 낀 탓인지 동행이 구해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와 함께 둘이 오른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의 한국인은 승무원과 우리 둘 뿐이었다.
‘몽탄신도시’ 울란바토르에서 만난 한국의 고속버스와 달리길 14시간. ‘홉스골’로 가기 전 장보기와 도시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끝낸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고 2시간을 달려 홉스골에 도착했다. 여름과는 달리 투어도, 가이드도 없는 여행인 만큼 3일을 한 숙소에서 묵으며 홉스골 주변을 떠돌았다.
몽골까지 왔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침 그 시기에 개봉한 영화 ‘하얼빈’을 촬영했다는 홉스골에서 개썰매를 타고 산책하다 밤이 되면 은하수를 찍고 보드카를 마셨다. 영하 35도까지 내려간다는 몽골의 추위는 왜 보드카를 물 마시듯 마시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해가 떠있는 낮 동안 살짝 따뜻해졌던 호수는 밤이 되면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얼어붙는다. 뜨거운 물을 허공에 뿌리면 얼음이 되어 비산하는 온도도 은하수에 대한 집념은 막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 몽골은 결코 편한 여행을 기대하고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몽골을 다녀온 후에 들었던 생각은 역시 ‘가길 잘 했다’ 였다. 힘든 만큼 색다른 경험과 풍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나이에 따라 느끼는 바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힘든 여정을 1%라도 덜 힘들게 느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다녀오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