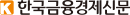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여신 잔액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배드뱅크 출연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9.0%로, 전년 말(8.52%) 대비 0.48%p 상승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 등으로 대출 영업이 위축되며 전체 여신 잔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여신 잔액은 94조9746억원으로 95조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전월(95조7067억원) 대비 0.76%(7321억원) 감소한 결과로, 지난해 6월(98조66억원)과 비교하면 3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부실채권을 정리 중인데 부실채권 정리 시 대출자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여신 잔액 감소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연체 관리 부담이 커지며 신규 대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저축은행 연체율을 5~6%대로 낮추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수익을 위한 무리한 대출 취급은 오히려 연체율 관리에 독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저축은행업계 책무구조도 마련 및 건전성 관리 관련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연체율이 5~6%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하면 기대 수익과 예상 연체율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많다 보니 대출을 늘릴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물 시장도 안 좋고 서민경제도 위축된 현재 상황에서 지금 대출을 늘리면 수익보다 연체율 관리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하기 위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약 4000억원을 금융권 공동 출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은행권이 3500억원, 저축은행과 보험 등 제2금융권이 나머지 5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아직까지 분담률이 정해지지 않아 예의주시 중이다. 최근 배드뱅크 관련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축은행보다는 대부업 쪽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폭탄’까지 예고됐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영업수익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된다. 이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45년 만의 첫 세율 조정으로, 업계에서는 금융권 전체에서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교육세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5곳만 해도,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육세(약 5063억원)에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 추정 추가 납부액인 4758억원을 더해 총 9821억원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세율 대상에 오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만 해당이 되는데,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고, 예산 제약이 바뀌며 다른 저축은행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현재 업황도 좋지 않아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해당 비용들이 모두 서민금융 재원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해당 정책으로 서민금융 재원이 빠져나가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율 관리·대출 축소·출연금·세금 인상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 대출금리 인상과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