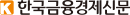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정진아 기자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올해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에만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상위권 건설사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28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22년 2.06 ▲2023년 1.98 ▲2024년 1.90으로 알려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10대국 평균의 2배를 상회한다.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1.59퍼밀리아드로, 평균치는 0.78퍼밀리아드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캐나다 1.08 ▲프랑스 0.97 ▲미국 0.96 ▲이탈리아 0.92 ▲스페인 0.72 ▲일본 0.68 ▲호주 0.34 ▲독일 0.29 ▲영국 0.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검토하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건설사들은 부랴부랴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이는 건설사들을 향한 당장의 ‘으름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대신, 곧바로 책임소재부터 묻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4월 발생했던 SKT 해킹 사고가 그랬다. 당시에도 원인과 범인을 잡기보다 ‘SKT 책임 묻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고, 결국 근본 원인 해결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예방책 없는 징벌은 건설업계에 악영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임원은 건설사 안전사고는 항상 예방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중점을 둬야지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위험도 항상 도사리기 때문에 징벌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징벌적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징벌이 불러올 또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건설 면허 정지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가족은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경제적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폐업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폐업시킬 순 없다”며 “차라리 지원책이나 실질적인 예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는 물론 유관기관과 근로자들까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 각종 기관, 근로자들까지 같이 모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관련 테스트, 안전문화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근로안전공단 등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를 잘 받아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국가·민간·공공기관·조합 등 발주처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가 안전과 관련해 항상 점검하면 안전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쓸 것”이며 “발주처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근로자들도 안전에 대한 생각이 변화할 것이고, 발주처도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