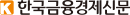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headlaner 기자 | 카카오톡 메시지 몇 줄과 계좌이체 2번으로 아파트를 산다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법원은 위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최근 법원은 모바일앱을 통한 아파트 청약, 분양상담사와 수분양자인 원고간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 통신, 카카오톡을 통한 분양계약서 원격대행작성만으로도 아파트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9394 판결).
위 소송에서 원고는 ① 분양상담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보낸 계약서에는 ‘계약서3·4면이 빠진 상태여서,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기지급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또한, ②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해서 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으므로 본인이 기지급한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도 했다.
③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결론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3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년 *월 원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토스’로 서울시내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청약했다. 피고(분양자)는 이틀 뒤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아파트 당첨 소식을 알리고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안내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금 중 일부 1000만원과 옵션 분양대금 중 일부인 28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분양대행사는 같은날 ‘위임받아 계약서 발행’이라 알린 뒤, 원고에게 ‘계약서 1·2면 사진’을 보내왔고, 원고는 해당 사진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며칠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서 3·4면이 누락됐으니 계약 불성립”이라며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위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첫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으로는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 잔금의 구체적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이 존재한다(대법원 2021. 9. 30.선고 2021다248312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본건 계약서와 입금안내문에는 ▲호실 ▲면적 ▲총분양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구체적 액수와 납부계좌·시기가 특정돼 있었다. 원고가 계약서 대행 작성에 동의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받아본 뒤 “감사합니다”라고 회신까지 해 위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까지 한 점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측은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3·4면(해제·위약금·입주절차등)은 ‘세부조항’일 뿐, 해당 세부조항의 누락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둘째, 이 사건 매매거래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다.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는 ‘판매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토스’ 앱을 통해 본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의 전화·메신저 소통은 ‘당첨 통지’와 ‘절차 안내’의 성격에 그쳤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판매자가 전화를 통해 ‘없던 수요를 만들어 내는 적극적 권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애초에 전화권유판매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14일 내 청약 철회’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셋째, 민법 제565조(계약금 계약에 기한 해제)는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교부된 후에야 작동한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약정 계약금은 4,251만 원으로, 원고가 납부한 1000만원은 ‘계약금 일부’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계약은 계약이다. ‘부분 공개된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표시와 증거의 양상만 달라졌을 뿐,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간의 의사 합치가 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약정 계약금 규모와 지급 스케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금 일부만 넣고도 돌아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법 앞에서 쉽게 꺾인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바쁜 일상생활을 이유로 비대면 방식의 계약 체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위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척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칫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나 철회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판례에서 보듯이 우리 법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분양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췄으나, 이번 판결은 그 편리함이 법적 책임의 가벼움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상기시킨다.
클릭 한 번, 이체 두 번,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 뒤에 따라오는 것은 종이 계약서 한 장과 다르지 않은 법적 구속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