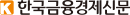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기는 하다.”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부담 경감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던 중 서민금융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연 15.9%라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10~20% 이하,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바탕으로 협약 금융사에서 상품을 취급한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고 그러면서 이자를 15.9%,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라면서 “연간 수십%를 내야 하는 사금융, 대부업체로 가는 것에 대한 차선책이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서민들이 15% 이자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 40조원씩 내면서 몇 백억원에 십몇%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나’와 비슷한 것이다.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말 그대로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아 이뤄지는 대출인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으면, 이런 상황에 놓인 서민들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죽을 지경’이다.
문제는 그 탓이 금융권을 향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만들어진 상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정책 방향과 상품 설계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을 탓한 것은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린 때문으로 보인다. 고신용자에게는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간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로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이 ‘경제 논리’에는 맞지만, ‘잔인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게다가 그 대상이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은 어려운 서민에게 고금리를 취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금융기관이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에 대해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그것이 금융거래의 가장 기본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책정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를 7~8% 받아야 한다”며 “대손률이 20~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권이 서민들이 처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올해 금융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약 300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 마련에 협조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자금난·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이 추진되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출연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이 사회 구성원의 돈을 운용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잘 설계되지 않으면 금융권이 이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 금융권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