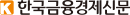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국내 상위 10대 저축은행들이 최근 약 5년 동안 예금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는 실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업권 구조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OK저축은행·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 등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9,631억 원에 달하는 법정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된 법정비용에는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부담분 ▲교육세 ▲햇살론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예금보험료가 7313억 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고 ▲지급준비금 부담비용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예금보험료율(이하 예보료율)은 현재 연 0.4%로, 시중은행(연 0.08%)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증권사(0.15%) ▲보험사(0.15%) ▲상호금융조합(0.2%)보다도 크게 높다. 저축은행에 이처럼 높은 예보료율이 적용되는 배경에는 2011~2012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다. 당시 다수 저축은행이 무너지는 위기가 발생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해 약 27조2000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예보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에 고요율이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됐고 부실 위험도 낮아진 만큼 합리적인 인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논란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법정비용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업계 평균 0.02%~0.03%에 불과하다”며 “대출이자 수익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약 2% 수준으로, 사실상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금리 산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신용원가와 조달원가이며, 법정비용은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일 뿐 모든 저축은행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준상 법정비용을 원가에 산정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에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의 경우 2023년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예보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모범규준(업계 자율규제 지침)이 개정됐으나, 저축은행은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업권 특성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원가와 조달금리가 낮고 보통예금금리도 0.1~0.2% 수준이나, 저축은행은 수신 금리가 20배 이상 높고 예금금리도 높기 때문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