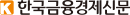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가운데, 정작 핵심 매입 대상인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조성한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자 약 113만명의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책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5년 이상 연체자 특별조정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출 지원을 마련해 역차별 우려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도약기금의 총 재원은 8400억원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부담하고 금융권이 44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 중 은행권이 36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신전문금융업계 300억원 ▲생명보험업계·손해보험업계 각 200억원 ▲저축은행 업계 100억원이 뒤를 잇는다.
은행권 출연금 3600억원은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하나증권은 ▲KB국민은행 560억원 ▲하나은행 530억원 ▲신한은행 470억원 ▲우리은행 460억원으로 예상했다. IBK기업은행은 400억원대, NH농협은행은 300억원대 수준이 유력하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각 은행에 새도약기금 출연금 청구서를 전달했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각 은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생 금융’ 차원의 부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은행 자본비율 관리나 주주환원 정책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 은행주 투자심리가 위축된 배경에는 새도약기금 출연과 국민성장펀드 출자 등 정부의 사회적 역할 요구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에는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권 자발적 협약에 기반해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이는 구조인데, 장기연체채권 7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부업체 중 협약 가입 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약 440곳 중 2~3% 수준이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헐값 매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약 5%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이는 시장가격(20~30% 수준)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업권은 이번 채무탕감 정책 관련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아 협약 미가입에 따른 제재도 없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 매입가율 재조정, 세제 혜택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은 최고금리 규제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조달비용은 높은 구조로 대출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다. 연체채권 매입·매각과 추심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이라며 “시장에서 30%대에 거래되는 채권을 5%에 사겠다고 하니 참여가 저조하고, 참여 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은 의무가 없는 만큼 당연히 가격을 두고 버티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이 빠지면 기금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줄어들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