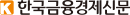한국금융경제신문=옥준석 기자 | 삼성생명이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았다. 대규모 보험계약마진을 통한 수익성과 생명보험산업 내 점유율 1위 시장지위, 자본 적정성 등이 평가 근거로 꼽혔다. 다만 금융환경의 변동성과 규제 지속에 따른 자본 적정성 관리는 부담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25일 신용평가사(신평사)들은 삼성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을 AAA 등급·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신평3사는 시장지위, 수익창출력, 자본적정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은 총자산 295조6000억원, 자기 자본 3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책임준비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30.7%를 기록하며 월납보험료 기준 27.5%의 점유율을 보였다.
보험계약마진(CSM)도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CSM 규모는 지난해 말 12조90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14조원으로 성장했다. CSM은 보험 계약에서 미래 발생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무저해지보험 관련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점과 연도 말 가정 변경 등으로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웃도는 신계약 CSM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보장성보험 중심의 신계약 CSM 규모를 유지하며, 배수가 높은 건강보험 비중을 확대해 CSM 잔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신계약 CSM 배수는 아직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 14.2배 수준의 월초보험료 대비 신계약 CSM 배수는 올해 3분기 12.0배를 나타냈다. 이는 보험업권 내 경쟁 심화, 금리하락, 환급강화형 건강보험 비중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앞으로도 경쟁이 심화될 전망으로, 신계약 CSM이 저하되고 CSM 잔액의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올해 4분기 계리가정 적용 후 CSM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 손익은 다소 부진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보험 손익은 1조9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했다. 영업일수 증가와 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등 손해율이 높아져 예실차 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유배당 연금과 무·저해지보험 가정 변경 영향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진단했지만, 나이스신용평가는 보수적 가정변경, 소명 계약 회계처리 변동 등의 일회성 요인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한국신용평가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험 포트폴리오의 구성·규모 여파로 작은 변수나 가정 변화에도 이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동성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경험 통계 등이 쌓이며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192.7%를 기록하며 업계 평균인 181.1%를 웃돌았다. 올해 1분기 177.2%까지 낮아졌지만, 삼성전자 지분가치 증가와 시장금리 상승 등 우호적인 요인 덕에 개선 중이다.
K-ICS 비율 관리에 대해서도 신평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국신용평가는 이익창출력과 CSM 확보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 완충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동재보험 활용, ALM 관리능력, 자본성증권 발행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율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기준 적용 등 규제 완화와 장기 금리 상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나이스신용평가는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 등 추가적인 자본규제 개편이 예정돼있는 점을 지목했다.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관리하기에 부담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평가이익 증가, 감소로 경쟁사보다 K-ICS 비율 변동성이 높은 점은 관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들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K-ICS 비율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장기선도 금리는 유지되고 규제자본비율 권고 수준이 하향되며, 할인율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은 장기화되는 등 자본관리 부담은 완화될 것이다”며 “다만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 등 추가적인 자본규제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자본규제제도 개선 등이 자본적정성 관리의 주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